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한강 시집
Original price was: $24.00.$18.00Current price is: $18.00.
영역: 시
대상: 일반
구성: 반양장본 | 168쪽 | 128*206mm
배송: 단행본 두권이상 미국내 무료배송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1 in stock (can be backordered)
Description
「저녁의 소묘」 「새벽에 들은 노래」 「피 흐르는 눈」 「거울 저편의 겨울」 연작들의 시편 제목을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조가 충분히 감지되는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에는 어둠과 침묵 속에서 더욱 명징해지는 존재와 언어를 투명하게 대면하는 목소리가 가득하다. “말과 동거”하는 숙명을 안은 채 “고통과 절망의 응시 속에서 반짝이는 깨어 있는 언어-영혼”(문학평론가 조연정)을 발견해가는 환희와 경이의 순간이 여기에 있다.
내가 가진 모든 생생한 건
부스러질 것들
부스러질 혀와 입술,
따뜻한 두 주먹
부스러질 맑은 두 눈으로
유난히 커다란 눈송이 하나가
검은 웅덩이의 살얼음에 내려앉는 걸 지켜본다
무엇인가
반짝인다
-「저녁의 소묘 4」 부분
죽음에서 삶이, 어둠에서 빛이 탄생하는 아이러니
늦은 오후에서 한밤으로 건너가는 시간(저녁), 다시 한밤에서 날이 새기 직전의 시공간(새벽)에 주로 깨어 있는 시인은 “부서진 입술//어둠 속의 혀”로 “허락된다면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피 흐르는 눈 3」) 한다.
이 어스름한 저녁을 열고
세상의 뒤편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등을 돌리고 있다
고요히 등을 돌린 뒷모습들이
차라리 나에겐 견딜 만해서
-「피 흐르는 눈 4」 부분
인간의 삶에 구체적이고 특별한 불행들이 생겨나기 이전, 시인은 “아직 심장도 뛰지 않는/점 하나로/언어를 모르고/빛도 모르고/눈물도 모르며/연붉은 자궁 속” “죽음과 생명 사이,/벌어진 틈”(「마크 로스코와 나」)에서 고통의 기원과 진실의 정체를 밝히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어깨를 안으로 말고/허리를 접고/무릎을 구부리고 힘껏 발목을 오므려서”(「심장이라는 사물」) 자신의 피 흘리는 육체를 담보 삼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누군가 내 몸을 두드렸다면 놀랐을 거야
누군가 귀 기울였다면 놀랐을 거야
검은 물소리가 울렸을 테니까
깊은 물소리가 울렸을 테니까
둥글게
더 둥글게
파문이 번졌을 테니까
-「눈물이 찾아올 때 내 몸은 텅 빈 항아리가 되지」 부분
몸속에 맑게 고였던 것들이
뙤약볕에 마르는 날이 간다
끈적끈적한 것
비통한 것까지
함께 바싹 말라 가벼워지는 날
-「해부극장 2」 부분
마르고 텅 비어가는 그 육체는 영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지(同志)이기에 결국 영혼도 부서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과 균열의 느낌은 어김없이 찾아든다.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어느 늦은 저녁 나는」 전문
그러나 시인은 이런 상실감과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정면승부를 한다. 스스로에게 재우쳐 다짐하듯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그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짐작건대 그가, 시집의 5부(‘캄캄한 불빛의 집’)에 실린, 대부분 시인의 이십대에 씌어진 시들에서 목도할 수 있는 벅찬 숨결, 더운 핏줄, 열정적 사랑, 푸릇한 청춘의 시절을 통과해왔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정면을 보며 발을 구를 것
발목이 흔들리거나, 부러지거나
리듬이 흩어지거나, 부스러지거나
얼굴은 정면을 향할 것
두 눈은 이글거릴 것
마주 볼 수 없는 걸 똑바로 쏘아볼 것
그러니까 태양 또는 죽음,
공포 또는 슬픔
그것을 이길 수만 있다면
심장에 바람을 넣고
미끄러질 것, 비스듬히
-「거울 저편의 겨울 9-탱고 극장의 플라멩코」 부분
薄明 비껴 내리는 곳마다
빛나려 애쓰는 조각, 조각들
아아 첫 새벽,
밤새 씻기워 이제야 얼어붙은
늘 거기 눈뜬 슬픔,
슬픔에 바친다 내
생생한 혈관을, 고동 소리를
-「첫 새벽」 부분
삶을 관통하는 불꽃같은 고통, 그토록 가슴 시린 한강 언어의 기원
이제 “얼음의 종이를 통과해/조용한 저녁이 흘러”(「저녁의 소묘 3」)들 때, 어둠 속에서 건너가보는 꿈속에서, 거울 저편의 정오나 혹은 거울 밖 검푸른 자정에서 “동그랗게 뒷걸음질 치는”(「심장이라는 사물」) 혀를 이용해 시인이 닿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언어, 삶의 본질, 고통과 절망 너머의 어떤 절실함과 회복의 풍경들이다.
내 안의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부분
이제
살아가는 일은 무엇일까
물으며 누워 있을 때
얼굴에
햇빛이 내렸다
빛이 지나갈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
가만히
-「회복기의 노래」 전문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에는 침묵의 그림에 육박하기 위해 피 흘리는 언어들이 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언어의 심장을 뜨겁게 응시하며 영혼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확인하려는 시인이 있다. 그는 침묵과 암흑의 세계로부터 빛나는 진실을 건져 올렸던 최초의 언어에 가닿고자 한다. 이 시집은 그간 한강 문학을 이야기할 때 맨 먼저 언급돼온 강렬한 이미지와 감각적인 문장들 너머에 자리한 어떤 내밀한 기원-성소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가는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뒤표지 글
전철 4호선,
선바위역과 남태령역 사이에
전력 공급이 끊어지는 구간이 있다.
숫자를 세어 시간을 재보았다.
십이 초나 십삼 초.
그사이 객실 천장의 조명은 꺼지고
낮은 조도의 등들이 드문드문
비상전력으로 밝혀진다.
책을 계속 읽을 수 없을 만큼 어두워
나는 고개를 든다.
맞은편에 웅크려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갑자기 파리해 보인다.
기대지 말라는 표지가 붙은 문에 기대선 청년은 위태로워 보인다.
어둡다.
우리가 이렇게 어두웠었나.
덜컹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
맹렬하던 전철의 속력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가속도만으로 레일 위를 미끄러지고 있다.
확연히 느려졌다고 느낀 순간,
일제히 조명이 들어온다, 다시 맹렬하게 덜컹거린다. 갑자기 누구도
파리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나는 건너온 것일까?
Additional information
| Weight | 2 lbs |
|---|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review.
You may also like…
-
Sale!

모순-양귀자 장편소설
Original price was: $26.00.$20.00Current price is: $20.00. Add to cart -
Sale!

불편한 편의점 2
Original price was: $28.00.$21.00Current price is: $21.00. Add to cart -
Sale!

작별하지 않는다
Original price was: $34.00.$26.00Current price is: $26.00. Add to cart -
Sale!

소년이 온다
Original price was: $30.00.$23.00Current price is: $23.00. Add to c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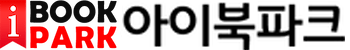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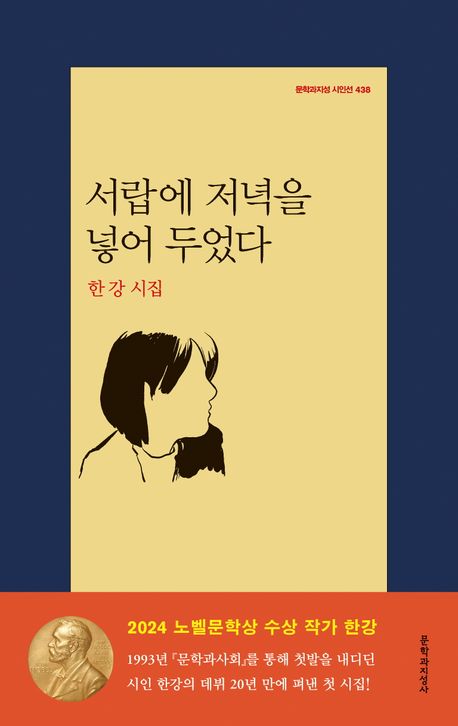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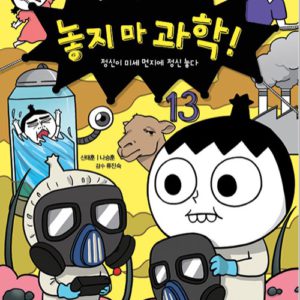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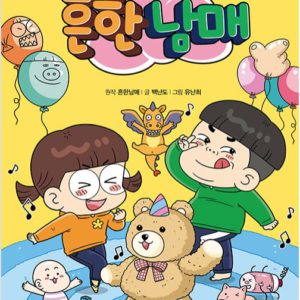
Reviews
There are no reviews yet.